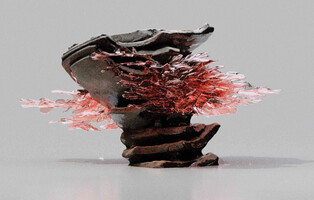건물의 자태를 돋보인게 하는 계단
계단용 목재 사용 더 이상 보기 어려워
 |
| ▲ 대방동 농심사옥 본사 중앙홀 |
사뿐히 즈려밟고 가야 한다. 진달래꽃 이야기가 아니다. 계단 이야기다. 계단은 오로지 누군가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한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만들어낸 이 위대한 발명품은 문명이 시작되면서 함께 등장했다. 기원전 3000년 경 메소포타미아의 신전에도, 기원전 1500년 경 크레타 섬의 궁전에도 계단은 있었다.
계단이 단순히 상승에 대한 욕망의 피사체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층의 바닥과 바닥을 잇는 통로로 건축에서 계단은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계단이 놓였다는 것은 이미 개방과 소통을 전제로 한다. 계단 위로 스토리와 정보가 흐르기 때문이다.
계단은 그 재료도 다양하다. 자연의 색감이 아름다운 나무계단,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지는 돌계단, 왠지 모르게 투박함이 정겨운 벽돌계단, 그리고 차가우면서 세련된 분위기의 철근콘크리트계단까지. 대부분의 도시 건물 속 계단은 시공과 관리 등이 편리한 철근콘크리트로 사용됐다.

자연의 질감으로 소통하는 공간
하지만 다른 건물들과 다르게 철근콘크리트 계단이 아닌 나무계단을 사용한 도심 속 빌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도 아프리카산 고급목재 아프젤리아 Afzelia 만을 사용했단다. 직접 찾아가보기로 했다. 장소는 신대방동 ‘농심’ 본사 신사옥 농심관. 16년 전인 1996년 신사옥을 지을 때 함께 시공된 계단이다.
아프젤리아는 나뭇결의 극치를 보여주는 괴목을 닮았다. 해충에 강하고 내구성과 보존성도 뛰어난 목재로 정평이 나 있다. 열대 아프리카 지역 중에서도 나이지리아와 카메룬에서 주로 생산되는 이 목재는 건물의 내·외장 구조재로 많이 쓰인다. 서울 올림픽 사이클 경기장의 바닥재도 아프젤리아가 사용됐다. 자전거 바퀴와의 마찰 계수가 가장 적어 속도가 생명인 사이클 경기에 유리해서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사원들이 아프젤리아 계단 위에서 발걸음을 서두른다. 계단 앞 엘리베이터 보다 인기가 더 많다. 사실 이 계단이 다른 회사들의 계단과 달리 즐겨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건물이 갖는 특징 덕분이다. 정식 명칭이 ‘농심 인텔리전트 빌딩’인 이곳은 각 층마다 천장이 낮고 벽이 없다. 낮은 천장은 각 계단을 부담 없는 높이로 만들어줬다.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다소 어수선할 수 있는 공간은 아프젤리아가 주는 차분한 정서로 단정히 정돈되어 있다. 정서만이 아니다. 나무는 흡음력이 뛰어나다. 소리를 단순히 반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로 전달시켜 실제적으로 차분한 공간을 만들어준다.
나무 계단의 관리는 특히 어렵다. 매일 쓸고 닦아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심은 나무계단을 사용했다. 건물 전체가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텔리전트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7층까지 이어지는 이 건물의 열린 천장 아래로 황갈색 아프젤리아 계단은 태양빛을 시시각각으로 갈아입으며 은은한 자태로 자신의 존재감을 뽐낸다. 건물의 천장에서 쏟아지는 따뜻한 햇살은, 아프젤리아 계단을 어둡고 음침한 비상구가 아니라 밝고 친근한 숲 속 산책로를 떠오르게 한다. 그렇게 농심의 사원들은 오늘도 아프젤리아 계단을 오르며 도심 속에서 생명력 넘치는 자연과 조우한다.
사진제공: 유림목재
[저작권자ⓒ 우드플래닛. 무단전재-재배포 금지]